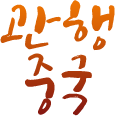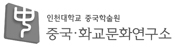ISSN 2508-2884 (Online)
-
2017.12
-
2017.12
-
2017.12
2017년 4월 1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뉴스거리 하나가 중국에서 터져 나왔다. 중국정부가 베이징(北京) 남쪽에 인접한 농촌지역을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슝안신구(雄安新區)’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베이징에 수도로서 필요한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제조 산업은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의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언론은 일제히 ‘천년대계이자 국가대사(千年大計, 國家大事)’로 추켜세우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직접 챙기는 국가프로젝트임을 특별히 강조했다. 국가최고지도자에 대한 과장된 수사를 남발하는 게 중국 언론의 일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함께 시진핑 시대를 상징하는 중국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1단계로 서울의 구(區) 서너 개쯤은 족히 되는 100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하고 2단계에선 20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선 무려 2,000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하겠다는 이 대규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서울의 서너 배가 넘는 초거대도시가 베이징 인근에 새롭게 탄생하는 셈이다.
슝안신구에 편입되는 지역은 슝(雄), 롱청(容城), 안신(安新) 등 세 곳으로, 모두 중국의 농촌 행정구역인 현(縣)에 해당하는 곳이다. 행정단위로 치면, 우리의 군(郡)쯤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차이만큼이나 중국의 현은 우리의 군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다. ‘슝안’이란 지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슝안신구
중국의 행정구획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보통이다. 즉, 하나의 시(市) 아래에 도시지역인 구(區)와 농촌지역인 현(縣)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최근 들어 베이징이나 톈진(天津) 등에서는 현을 모두 구로 전환해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농촌이 갑자기 도시가 되는 건 아니다. 이상 세 개의 현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모두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시(保定市)에 속하는 명실상부한 농촌지역이다.
사실, 바오딩은 우리에게도 매우 낯선 지명이지만 중국인에게도 그리 익숙한 지역은 아니다. 수도인 베이징이나 수도의 관문인 톈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바오딩은 풍문으로나 들어봄직한 그저 못사는 이웃동네일 뿐이다. 실제로 1인당 GDP 수준으로 봐도, 바오딩은 베이징이나 톈진의 1/4 수준에 그친다. 허베이의 타 도시들과 비교해도 경제수준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다. 속된 말로, ‘깡촌’ 중의 깡촌인 셈이다.
바오딩도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북방에서는 꽤 잘 나가는 도시 중의 하나였다. 물론, 전국적으로 ‘노는’ 베이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말이다. 바오딩이 삼류 취급을 받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청나라 시기에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일괄해 즈리성(直隸省)이라 했다. ‘즈리’란 수도 베이징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임을 뜻한다. 우리로 치자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쳐놓은 꼴인데, 이 즈리성의 행정소재지가 바로 바오딩이었다. 그러고 보면, 행정권력 상으로는 중국북방에서 베이징 다음 가는 곳이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청나라 이전에도 베이징을 수도로 삼은 왕조들에게 바오딩은 가장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수도방위를 책임질 대규모 병력을 지척지간인 이곳에 주둔시킨 것이다. 우리로 치면, 의정부와 동두천처럼 수도권을 방어하는 군사도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정치·행정상의 권력과 군권을 나누기 어려웠던 과거 왕조시대에는 위상이 훨씬 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바오딩에 남아있는 즈리총독부원 입구(상)과 내부(하)
중국북방에서는 최소한 베이징, 톈진 다음 가는 ‘넘버쓰리’에 해당하는 바오딩이었지만, 이 두 대도시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다 보니, 늘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모양이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이 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비꼬아 이렇게 말하곤 했다. 베이징 사람들은 ‘수도 뺀질이(京油子)’, 톈진 사람들은 ‘부둣가 주둥이(衛嘴子)’ 그리고 바오딩 사람들은 ‘사냥개(狗腿子)’. 베이징 ‘뺀질이’는 이곳 사람들이 하도 높으신 양반들도 많고 권력다툼도 잦은 황제의 도시에 살다보니, 자연 권모술수에 능하고 약은 짓도 밥 먹듯이 한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중국인들에게 톈진 사람은 베이징 밑에서 운하와 항구를 낀 채 벌어먹고 사는 장사치란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그런데 주 고객인 베이징의 높으신 양반들을 하도 많이 상대하다보니 자연스레 말발이 세졌는지, 어느새 ‘주둥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경멸과 조롱이 잔뜩 섞인 이 별명들은 ‘사냥개’로 불리는 바오딩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럼, 사람들은 왜 바오딩 사람들을 ‘사냥개’라 했을까? 전해지는 유래는 이렇다.
1937년 일본의 본격적인 중국침략이 시작되었다. 북방 일대를 점령한 일본군은 바오딩을 핵심 주둔지이자 행정수도로 삼았다. 당시 바오딩은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면서, 근대화의 첨병인 철로가 바로 아래 지역인 스자좡(石家莊)을 관통하는 바람에 허베이 제1의 도시라는 위상을 점차 잃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그랬던 바오딩이 일본침략 덕분에 다시 그 지위를 탈환하게 된 것이다. 일본군이 물러간 뒤 장제스(蔣介石)의 국민정부 치하에서도 바오딩은 국민당군의 주둔지로서 동일한 위상을 누렸다. 하지만 공산당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일본 놈과 국민당 반동분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하여 바오딩 사람들을 ‘사냥개’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분히 바오딩 출신들이 만들어냈을 것 같은 이 설을 간단히 풀자면 이렇다. 원래는 사냥개를 뜻하는 ‘狗腿子’가 아니라 다리를 후려 넘어뜨린다는 의미의 ‘鉤腿子’였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 하면, ‘발길질을 잘하는 싸움깨나 하는 놈’쯤 될 것이다. 사실, 바오딩 사람들은 베이징이나 톈진 같은 대도시 사람들처럼 머리를 쓰거나 입을 놀리기보다는 몸 쓰는 일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다. 싸움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하필 발을 이용한 싸움일까? 실제로 바오딩이 발원지인 전통무술이 아직도 남아있다. ‘바오딩 씨름(保定摔跤)’이라고 하는 무술인데,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려 땅에 처박는 걸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도와 닮았고, 몸을 부대껴 싸우는 것보다 발로 잽싸게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이 더 발달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택견과도 비슷하다.
무술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설이 있다. 하나는 명나라 영락제(永樂帝)의 황위찬탈을 도운 공로로 토지를 하사받아 바오딩에 안착하게 된 몽고족 형제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멀리 칭기즈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슬람교도로 구성된 몽고제국의 외인부대가 바오딩에 주둔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전파한 서역의 무술로부터 기원했다는 설이다. 그렇지만 딱히 어느 하나의 설이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래도 예전부터 다양한 무술이 하나로 섞이면서 오늘날의 바오딩 씨름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성 싶다.
바오딩 씨름
바오딩 사람들이 싸움꾼이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겠다. 대대로 중국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베이징 사람들과 돈 많은 장사치인 톈진 사람들이 몸을 쓰는 일을 즐겨 했을 리는 만무하다. 반면, 뒷배도 없고 돈도 없는 바오딩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로 몸을 쓰는 일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싸우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던 군인들이 자주 주둔했던 바오딩이고 보니, 싸움기술을 익힐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법도 하다. 역시 짐작이지만, 주색잡기에 빠져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바람에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할 신세가 되어버린 퇴역군인들이 그저 바오딩에 무술도장 하나 열고 주먹질, 발길질이나 가르치며 소일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뭐 있겠는가. 아무튼 이런 인간들로 넘쳐나는 바오딩에서는 자신을 지킬 싸움기술 하나쯤은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바오딩 사람들이 권력과 돈은 없을지라도 어쨌든 싸움 하나는 잘 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세간에는 또 이런 입말도 있다. “베이징 뺀질이 열 놈이 톈진 구라쟁이 한 놈을 못 당하고, 톈진 구라쟁이 열 놈이 바오딩 왈짜 한 놈을 못 당한다.” 바오딩 사람들의 강인한 이미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현실이 정말 그랬을까?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라도 팔뚝이 굵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을 당장 눈앞에서 마주치면 우선 몸을 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삶 전체를 보면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을 것이다. 길 가던 말 많고 돈 많은 톈진 장사꾼 한 명이 우연히 바오딩 왈패의 발길질에 한 차례 수모를 당하는 동안, 가난한 바오딩 농민 열 명은 톈진의 부자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을 터이다. 또 점잔빼는 베이징 관리가 톈진 사기꾼에게 뒤통수를 한 차례 맞는 동안, 권력을 쥔 베이징 고관대작은 열 차례쯤 톈진 장사치로부터 뇌물을 받고 백 명쯤의 바오딩 사람들에게 평생 위세를 부렸을 것이다. 권력, 돈, 몸의 서열이 중국이라고 달랐을 리 없다.
바오딩이 몸과 폭력으로 규정되는 또 다른 기억은 문화대혁명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바오딩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항구를 가진 거대한 산업도시 톈진과는 이미 상대가 안 되었고, 청나라 말기까지 촌구석이었던 스자좡마저 철도 교통의 중추로 떠오르며 사실상 바오딩을 제친 지 오래였다. 물론, 1949년 이후 십년 동안은 허베이의 성회(省會) 즉, 행정소재지의 지위는 꾸역꾸역 지켜내고 있었다. 이제 막 건국된 가난한 중국으로서는 소재지를 옮길 돈 한 푼이나마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약진운동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생산력 증가가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1958년 공산당 지도자들은 공업이 발달한 직할시 톈진을 낙후한 허베이에 편입시키고 성회의 지위를 안겨주었다. 문화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던 1966년 5월이 되어서야 바오딩은 성회의 지위를 되찾았다. 바오딩이 갑자기 발전해서가 아니라 베트남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침략이 목전에 다다랐다고 본 중국정부가 전쟁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될 바닷가의 톈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내륙의 바오딩으로 성회를 옮긴 것이다. 또한 문화대혁명을 앞두고 극좌적 분위기의 고조로 대도시에 대한 집중보다는 지방으로의 권력분산이 강조된 이유도 있다. 요컨대 낙후했기 때문에 바오딩이 다시 성회가 된 것이다.
문화대혁명이 심화되면서 바오딩의 허베이성 정부는 혁명위원회로 바뀌고 홍위병들이 기존의 공산당과 정부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홍위병들은 마오쩌둥과 혁명에 대한 신심을 경쟁하며 파벌을 나누어 총칼을 들고 싸웠다. 불행하게도 공산당과 정부기관이 집중된 성회가 된 덕분에 문화대혁명의 폭력이 허베이에서 으뜸일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바오딩인의 몸에 역사적으로 각인된 폭력적 성향이 발휘된 것인지도 모른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얼마나 죽고 다쳤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지만, 바오딩이 폭력과 야만이 가장 심했던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도 베이징의 바로 옆에서 살벌한 폭력이 벌어지고 폭력이 산업을 더 후퇴시키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 1월 바오딩은 스자좡에 다시 성회를 내주어야 했다. 이전까지는 성회라고 별다를 게 없었을지 모르지만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어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정부의 투자는 모두 스자좡에 집중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스자좡은 바오딩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자리에 올라서있다.
중국은 왜 하필 원시적인 몸과 폭력으로 기억되는 가난한 깡촌 바오딩에 ‘천년의 대계’인 슝안신구를 건설하려는 걸까?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뜻하는 이른바 ‘징진지(京津冀)’의 종합발전계획이 2015년 10월에 완성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찔끔찔끔 알려지고 있을 뿐 계획서 전문은 아직도 비공개 상태에 있다. 슝안신구 발표 직전인 2017년 2월에 시진핑 주석이 현지를 다녀갔다는 사실도 계획 발표 당일에야 공개되었다. 시진핑이 직접 결정했다는 보도가 빈말은 아닌 듯하다. 그러고 보면, 슝안을 신도시 부지로 선택한 정확한 이유는 어쩌면 시진핑만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나마 베이징의 뺀질이 학자들과 언론들은 바오딩의 낙후한 농촌지역이 아무 것도 없는 백지와 같아서 외려 거대한 계획을 새로 그리기에는 제격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떠들었다. 이런 말이 기분은 나쁠지라도 어찌됐든 현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과거 서울 옆의 분당, 일산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오딩도 큰돈을 쥐어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오를 만하다.
그러나 슝안신구개발계획이 발표된 다음날 중국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중지를 명령했다. 일체의 거래가 중단되었음에도 황량한 시골길이 베이징 뺀질이들과 톈진 구라쟁이들의 고급승용차로 정체를 겪었다고 한다. 바오딩의 건물주들은 땅값, 집값이 서너 배는 오를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오를 임대료가 벌써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이징에서 진작 옮겨왔던 비효율적이고 더러운 공장들은 슝안신구라는 위대한 이름에 부응코자 다시 한 번 바깥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로 인해 바오딩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첨단산업 덕에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베이징에서 옮겨올 첨단 공장들이 대기오염이 심한 북방에서도 공기가 안 좋기로 수위를 달리는 바오딩을 좀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지 아니면 주변으로 밀린 공장들과 함께 더 암울한 결과를 낳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중국정부의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볼 때, 바오딩은 깡촌의 신세는 면할 것이다. 문제는 거대한 계획과 개발이 다 그렇듯 어김없이 그것을 따라오는 어두운 이면이다. 이 새로운 도시가 환희와 부귀를 불러올지 아니면 동시에 바오딩인의 오래된 거친 습성을 일깨워 분노와 저항을 일으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이건 남의 나라 속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몇 년 뒤에 슝안신구의 첨단화된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더 마셔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도시이야기 12】
조형진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 이 글은 김지환·손승희 엮음, 『중국도시樂』, 학고방, 2017에 수록된 글임.
참고문헌
Meng Jing, 「What happens to a Chinese backwater when it becomes the centre of Xi Jinping’s futuristic dream city?」,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4.5, www.scmp.com.
「以習近平同志為核心的黨中央謀劃知道京津冀協同發展三週年紀實」, 『新華社』, 2017.2.26 xinhua.net.
劉振宇, 「探究“保定快跤”」, 『蘭台世界』, 2014. 4月上旬.
『中國經濟周刊』 14期, 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