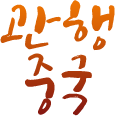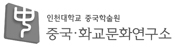ISSN 2508-2884 (Online)
-
2017.04
-
2017.04
-
2017.04
-
2017.04

『그래도 살아야 했다』
(원제 : 悲慘回憶)
王永晉 著/송승석 譯/王淸德 監修
이 책은 중화민국 외교관으로 1937년 중일전쟁 직전부터 조선이 해방되는 1945년까지 조선에서 근무했던 왕용진(王永晉)이란 인물의 개인 회고록이다. 그러나 이 회고록은 그의 조선 근무기간을 포함해 이전과 이후에 걸친 굴곡진 개인사는 물론, 식민‧분열‧냉전 등 격동의 동아시아 현대사를 일관되게 좇고 있는 일종의 역사기술이기도 하다.
회고록을 통해, 우리는 일본이 중국대륙침략을 본격화하는 중에 자행했던 각종 역사적 사건들이 일반 민초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도 가늠해볼 수 있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이자 만주국 유일 황제였던 푸이(溥儀)와의 직접적 대면과 대화에 기초해 봉건왕조의 몰락 과정과 그 필연성에 대한 단면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중국 성립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분열과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과 같은 정치적 암흑의 상흔들이 왕용진의 눈과 귀를 통해 생생한 화면으로 재구성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의 자서전 성격을 넘어 역사적 글쓰기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1930년대 초, 난징(南京)에 있는 중화민국 외교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왕용진이 조선에 부임한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7년이다. 당시 중국의 정치지형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그리고 이른바 괴뢰집단이라 칭해지는 푸이(溥儀)의 만주국으로 삼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충칭(重慶)으로 옮겨갔고 난징에는 또 다른 친일정권이라 할 수 있는 왕징웨이(汪精衛)의 난징국민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왕용진의 고난에 찬 삶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장제스의 국민정부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파견되었던 그는 조선의 중국인사회가 사실상 왕징웨이정권의 손아귀에 포섭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위 ‘한간(漢奸)’ 즉, 매국노란 멍에를 뒤집어쓴 채 공직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두 정권에 걸친 그의 10여 년 외교관생활은 1945년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마감된다. 당시 그의 마지막 직책은 원산영사관 영사였다.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이른바 ‘친일파’란 오명이 고향 대신에 그를 소련 하바롭스크 전범수용소로 이끌었던 것이다. 소련에서의 참혹했던 5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은 그로 하여금 가족을 잃게 했고 조국을 잃게 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다. 하루속히 가족을 찾아 조국 중화민국에서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유일한 희망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1950년 고향 중국에 돌아왔지만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처자식도 없었고, 중화민국도 없었다. 7년간의 노동교화소 생활, 밀항 실패로 인한 무기징역과 수형생활. 그렇게 그는 고향 중국에서의 30년 삶 대부분을 홀로 교도소를 전전하며 지내야 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지 그는 1980년 청천백일기가 나부끼고 삼민주의가 구현되는 중화민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가족을 만났다. 그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 드디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고향의 공산주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타향의 자본주의 중국, 다시 말해 타이완에서의 그의 삶 역시 그리 녹록치 않았다. 타이완 중화민국정부는 정작 그의 외교관으로서의 이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한간으로서의 경력만을 부각시켰다. 결국 그는 물질적·정신적으로 힘겨웠던 10여년의 타이완 삶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평생 자유를 갈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물리적 고향인 공산주의 ‘조국’ 중국대륙을 등지고 이념을 따라 자본주의 ‘정권’인 타이완 중화민국을 택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물리적 고향인 중국도 아니고 이념적 정권인 타이완도 아닌 제3의 땅, 한국에서 100년의 생을 마감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란 무엇이었을까? 그는 줄곧 정치적 자유를 갈망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가 원했던 자유는 이념이나 국가 따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족의 품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왕용진은 참으로 기묘했던 자신의 운명을 기록으로 남겼다. ‘비참한 기억(悲慘回憶)’이란 제목의 이 육필원고는 1945년 소련으로 끌려갈 당시 복중에 있던 막내아들 왕칭더(王淸德)를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그가 기록을 통해 세상에 대고 외치고자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
2024.05
-
2024.05
-
2024.05
-
2024.04
-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