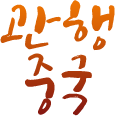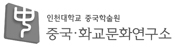ISSN 2508-2884 (Online)
누군가의 진심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 아마도 눈일 것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와 대화할 때 눈동자를 주시한다고 한다. 눈 맞춤을 피하거나 동공이 확장되고 떨린다면 그의 말이 거짓일 확률이 높다. 사랑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다. 눈을 보고 말해야 한다. 멍한 눈으로 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맹자도 말했다.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눈동자는 그 악함을 감출 수 없다. 가슴 속이 바르면 눈동자도 밝고 가슴 속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도 흐리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눈동자가 밝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눈동자가 흐리다고 했다. 인간의 내면은 눈동자를 통해 표현된다. 눈은 마음의 창문과 같아서 사람의 내면을 외부세계와 소통하게 한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초상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눈동자와 예술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했다. 동진의 고개지(顧愷之)는 인물을 그릴 때 눈동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고개지는 사람을 그릴 때 몇 년 동안 눈동자를 그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신체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림의 묘처와 무관하지만 정신을 전달하여 참모습을 그리는 것은 여기(阿堵, 아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여기는 눈동자를 가리킨다. 원문에는 아도(阿堵)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로 아도는 눈동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림의 성공은 표현하는 인물의 외모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다. 인물이 미인이라서 훌륭한 그림이 되고 인물이 추녀라서 실패한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초상화가 되려면 그 사람의 내면을 잘 표현해야 한다. 그리는 사람이 단호한 원칙주의자라면 냉정하고 엄격한 면이 드러나야 한다. 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낭만파라면 여유와 자유로움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 관건이 눈동자라는 것이다. 외모를 아무리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눈동자 때문에 그림을 망친다면 쉽게 붓을 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1. 동진 고개지의 초상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성어가 있다. 금릉 안락사에 흰 용이 네 마리 있었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더니 화가가 이렇게 말했다. “눈동자를 찍으면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허황하다고 비웃으며 억지로 점을 찍게 했다. 잠시 후 천둥 번개가 담벼락을 치고 두 마리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두 마리 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 수록된 이야기로 남조 때 화가 장승요(張僧繇)의 일화다. 눈동자가 없을 때는 생명이 없었는데 눈동자가 생기니 생명이 생겼다. 이 이야기도 예술 창작에서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설명하는 사례였다.
예술은 정신을 표현해야
화가에게는 표현하기 쉬운 장면도 있고 어려운 장면도 있다. 이에 대해 고개지는 이렇게 말했다.
손으로 다섯 줄 현을 뜯는 것은 쉽지만 돌아가는 기러기를 지켜보는 것은 어렵다(手揮五絃易, 目送歸鴻難)
“手揮五絃(수휘오현)”, “目送歸鴻(목송귀홍)” 여덟 자는 혜강의 연작시 <증형수재종군(贈兄秀才從軍)>의 제9수에서 인용한 말이다. 전자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모습이고 후자는 고향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물끄러미 지켜보는 모습이다. ‘목송(目送)’ 두 글자는 눈으로 지켜보며 전송하는 것이다. 고개지는 전자가 그리기 쉽고 후자가 그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왜일까? 거문고를 연주하는 모습은 외형만 똑같이 그려도 되지만 기러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깊은 감정과 사연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왜 한밤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무슨 사연이 있어 가족과 멀리 떨어졌을까? 알 수 없다. 이 미묘하고 복잡한 분위기를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21년 중국 대학입시에 이 구절이 출제된 일도 있다.
고개지(顧愷之)의 회화이론에 전신사조(傳神寫照)라는 개념이 있다. 전신은 정신을 전달한다는 뜻이고 사조는 형상을 묘사한다는 뜻이다. 신사(神似)와 형사(形似)라는 말도 있다. 내면의 정신을 묘사하는 것을 신사라 하고 외형을 똑같이 묘사하는 것을 형사라 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신사다. 동양화 중에는 원근법에 맞지 않고 제멋대로의 구도를 지닌 작품이 많다. 신사를 형사보다 중시하는 예술적 전통 때문이다. 자연의 모습을 똑같이 모방하거나 재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산수의 광활함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을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여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의 화폭에 담는 것도 가능했다.

그림 2. 조선 겸재 정선의
시 창작의 화룡점정
눈동자를 중시하는 예술론이 있다보니 시학에도 시 창작의 관건을 눈동자로 표현하는 이론이 생겼다. 시안(詩眼)이다. 시의 눈동자라고 할까? 한시는 오언시, 칠언시처럼 한 구에 사용하는 글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시안은 그 중 가장 뛰어난 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백의 시 <금릉주사유별(金陵酒肆留別)>을 보면 “오의 아낙은 술을 짜며 객을 불러 마시라 하네(吳姬壓酒喚客嘗)”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시안은 세 번째 글자인 ‘압(壓)’자다. 제목의 금릉은 지금의 남경이고 주사는 주점이다. 청년들이 술집에 모여 왁자지껄 이별의 술잔을 나누고 있다. 계절은 버들 꽃 한창이고, 주흥이 청춘의 활력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술을 따르거나 건네는 등의 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이백은 누른다는 의미의 ‘압(壓)’자를 썼다. 주모가 지게미를 눌러 술을 짜냈다는 말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 술독이 금세 바닥났던 모양이다. 술을 부었다, 또는 따랐다고 했다면 너무 뻔하고 평범했을 것이다. “가려다 가지 못하고 각자 술잔을 비운다(欲行不行各盡觴)”는 다음 구절과의 관계가 자연스럽다. 누른다는 말은 이별의 아쉬움과 전혀 관계없는 단어지만 이백은 연결시켰다. ‘압(壓)’자는 탁월한 미감을 발휘했다. 주제를 부각시키면서도 예술적 미감을 극대화하고 시에 활력을 부여했다.

그림 3. 남송 양해(梁楷)의 <이백행음도(李白行吟圖)>
시안의 사례를 하나 더 보자. 북송 왕안석(王安石)의 <박선과주(泊船瓜洲)>에 이런 구절이 있다.
봄바람이 강남 언덕을 또 푸르게 하겠지(春風又綠江南岸)
1075년 왕안석이 두 번째로 재상에 임명되어 경성으로 가는 길에 쓴 칠언절구다. 봄바람과 푸른 강 언덕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유이다. 정치개혁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시는 그가 정치개혁에 실패한 후, 정치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가는 길에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글자 ‘또 우(又)’자는 이런 그의 상황을 말한다. 이 시의 시안은 ‘록(綠)’자다. 홍매의 《용재속필》에는 그가 이 글자 때문에 매우 고심했다는 일화가 있다. 처음에 “도(到, 도착하다)”를 썼다가 ‘과(過, 지나다)’자로 고쳤다. 또 ‘입(入, 들다)’으로 고쳤다가 ‘만(滿, 가득하다)’으로 고쳤는데 열 번 넘게 고치다 마지막에 ‘록(綠, 푸르다)’으로 결정했다. 글자를 바꾸니 춘풍이 강 언덕을 푸르게 변화시켰다는 뉘앙스가 되었다. 초록은 긍정적인 심리의 상징이다. 황제가 다시 자신을 불렀다는 기쁨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명대의 하이손(賀貽孫)은 “글자를 고르는 것은 벽의 용 그림에 눈동자를 찍으니 비늘이 꿈틀거리며 날아오른 것과 같다. 한 글자의 놀라운 능력이 온 구절을 기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화룡점정 이야기를 비유로 시 창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눈동자를 그린 후 그림에 활기와 생명력이 생긴 것처럼 시를 창작할 때도 뛰어난 한 글자가 작품에 생기와 활력을 만든다는 것이다.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가 ‘문을 민다(推)’와 ‘문을 두드린다(敲)’를 놓고 고민했던 일도 이 때문이다. 퇴고(推敲)라는 말의 유래다.
이규일 _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해당 글은 중국학술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위키피디아
그림 2: 위키피디아
그림 3: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