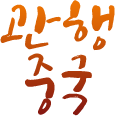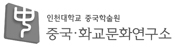ISSN 2508-2884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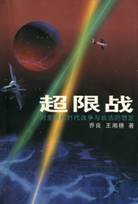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중국이 가장 첨예한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윤 대통령측은 작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 육필 원고의 형태로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를 국내 정체세력과 중국의 공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엄 옹호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무차별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치와 이념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주장들의 진위와 타당성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만큼이나 동화 같은 상상력이 첨가된 ‘선관위와 99인의 중국인’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도 설득이 될 리 없다.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과 다른 한국 화교들의 의대 입학 특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반중의 전략적 근거로도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초한전’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개념이 윤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반중의 근거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전략적 사고의 흔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독재와 전체주의가 사용하는 정치인 매수, 선거 개입, 사이버전 등을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 전술의 개념으로 지칭했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보수 유튜브 등에서 반중의 주요한 논거로 자주 등장했던 ‘초한전’ 개념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초한전’은 중국 공군 장교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1999년 출간한 동명의 저서인 『초한전(超限戰)』으로부터 유래했다.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제목 그대로 전쟁과 그 수단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주장이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전쟁의 개념, 영역, 수단이 완전히 변했다. 군사/비군사의 경계가 사라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수단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군사와 안보 영역을 초월하여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사상, 심리, 생태 등의 영역에서 가능한 수단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한전’은 중국이 국제법과 윤리 따위는 무시하고 정치인 매수, 언론 조작, 선거 부정, 금융 교란, 기술 탈취, 스파이 활동, 마약 확산, 범죄 촉발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수용되고 있는 초한전은 왜곡된 측면이 많으며, 그 위상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초한전』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은 1991년 걸프전이다. 저자들은 초판 서문을 걸프전 8주년에 맞춰 1999년 1월 17일에 썼다. 미국은 기존의 전쟁과 달리 육군과 해군이 아니라 압도적 공군력을 중심으로 완승했다. 또한 최대한 동맹국을 끌어들이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극대화했다. 저자들의 평가로는 초한전의 전략과 전술을 완벽히 적용하지 못했지만, 초한전은 걸프전과 미군에서 시작되었다. 기실 『초한전』에는 현대 중국과 중국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손자병법』 같은 고대 중국의 병서가 인용될 뿐이다. 『초한전』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책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한전 개념은 걸프전으로 확인된 미국과 미군의 압도적 우위에 대한 중국의 경계와 공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서 출간 직후인 1999년 5월 7일, 때마침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군이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하여 중국인 세 명이 사망했다. 정점에 이른 반미 감정과 민족주의가 『초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데 공헌했음은 물론이다.
그 기원이 어찌 되었든 중국이 초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안보, 군사, 전략에 관심있는 독자라면, 『초한전』을 읽고 나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새로운 주장인가? 인기에 힘입어 여러 차례 출간된 재판에서 차오량과 왕샹수이는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 등의 개념이 『초한전』에 빚진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전쟁에서 비군사적 수단이 유용하며 국가 간 경쟁에서 어떠한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새로운가? 국가 간의 간첩질과 이간질이 이전에 없었는가? 굳이 학술적 권위를 빌려오자면, 군사와 전략의 역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자 중 한 명인 윌리엄슨 머레이(Williamson Murray)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고대부터 존재했다고 본다. 그가 편집한 한 권의 저서가 온전히 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초한전』의 명성을 뒷받침하는 사소한 내용으로는 1999년 출판된 『초한전』이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예측했다는 주장도 있다. 『초한전』의 독창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맞으려면, 빈 라덴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기보다는 파멸적인 인터넷 해킹이나 미국식 ‘IMF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혼란을 일으켜야 했을 것이다. 아니면 당시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조지 소로스가 영국과 동아시아에 이어 미국 경제까지 건드리면서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빈 라덴의 테러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성격이 없지는 않겠지만, 형태 자체는 매우 전통적인 테러에 가까웠다. 『초한전』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가 빈 라덴이었기 때문에 몇 차례 등장했을 뿐이다. 저자들도 이러한 과장된 평가를 짐짓 즐겼던 걸로 보인다.
중국이 정말로 초한전을 자신들의 전략으로 채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중국공산당, 정부, 군대 어디에서도 초한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중국이 초한전을 비밀리에 실제 국가전략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완벽하게 부정할 수도 없다. 중국의 비밀스러운 전략을 확인할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간접적이지만 『초한전』의 위상을 살펴보자. 차오량과 왕샹수이의 최종 계급이 반영되어 『초한전』을 중국 공군 소장과 대교(大校, 우리의 대령 또는 준장에 상당)가 썼다고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초한전』을 출간할 당시 둘은 모두 대교였다. 제1 저자인 차오량은 공군 소속의 작가였다. 중국은 우리 군과 달리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교가 따로 있고 장성까지 진급할 수 있다. 아직까지 현역 소장이라는 설이 있는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도 인민해방군 소속 가수였다. 『초한전』을 쓰기 전까지 차오량은 주로 소설을 썼다. 정치장교였던 왕샹수이도 야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으며, 주로 책을 쓰는 데 집중했다.
야전 경험이 거의 없이 주로 문예 업무에 종사하던 대령들이 공개적으로 쓴 저서가 중국의 실제 군사안보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 초판을 찍은 출판사도 해방군문예출판사(解放軍文藝出版社)였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교재나 필독서로 활용했다는 것도 재판된 책에서 자랑스럽게 언급했지만, 공식적인 근거가 없다. 중국 내에서 『초한전』은 꽤 많이 팔린 군사안보 분야의 대중 교양서였을 뿐이다. 이 인기에 힘입어 군사학교에서 참고서적 정도로는 활용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대중적 인지도와 달리 영미권의 군사안보 관련 학술서적에서 『초한전』이 진지한 이론과 탐구의 대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초한전』과 두 작가의 명성은 오히려 해외에서 역수입된 측면이 많다. 1996년 대만 최초의 직선제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대만 독립 노선으로 기울고 있는 리덩후이(李登輝)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대만 주변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미사일을 발사해댔다. 제3차 대만해협 위기다. 총통이 된 리덩후이가 1999년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특수한 국가간 관계라는 특수양국론(特殊兩國論)을 공표하자 중국은 다시 군사적 위협을 높였다.
때마침 발간된 『초한전』은 중국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의 위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비슷하다.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중국위협론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의 공세적 대응에 따라 2000년을 전후로 크게 확산했다. 이때부터 초한전이 서구의 언론, 싱크탱크 그리고 일부 고위급 장교들에게 인용되면서 마치 중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안보전략처럼 수용되었다.
『초한전』의 내용이 그다지 새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때를 잘 만나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초한전 개념을 중국만의 고유한 군사안보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은 본래의 내용과도 어긋나는 데다 너무 순진하거나 고의적 왜곡이다. 첨단기술의 발달이 초한전의 핵심 요인인 만큼 사실 여기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만 포함하여 전세계를 도청하고 감시하는 파이브아이즈를 운용하고 있다. 이미 냉전 시기부터 CIA는 국가학생협회(National Student Association, NSA)를 조종하여 국내의 학생운동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간 미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대거 스파이로 활용했었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고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막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중국을 두들길 듯하더니 여전히 주판알을 튕기며 협상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6년 만에 자민당이 베이징에 가서 정당 교류를 재개하고 고위급 장교들까지 상호 방문을 다시 시작했다. 초한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중국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화를 내주고 주먹질을 해대면서 대신 욕을 먹고 처맞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초한전을 벌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초한전의 세계관을 내면화한다는 점이다. 군사/비군사, 전쟁/평화의 구분이 사라진다. 한국과 중국은 상시적인 전쟁 상태가 된다. 중국의 모든 행위를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에 상관없이 적대적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전쟁 상태로 인식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적군이나 스파이로 규정한다. 심지어 초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중국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오도된 초한전 세계관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쟁 상태로 만들어 파괴한다.
반중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안보와 번영,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중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념 대립의 과정에서 진영을 나누는 기준으로 반중이 제시되면서 ‘전략적 반중’이 불가능해졌다. 감정적이고 이념화된 무조건 반중만이 남았다. 상상된 전쟁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고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더구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제시된 반중의 이유들은 켜켜이 쌓여 우리가 반중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더라도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초한전 자체의 내용과 위상을 과장하는 왜곡, 이를 중국만의 사악한 속성으로 인식하는 무지, 우리 사회를 진짜 전쟁 상태로 몰고 가는 상상된 전쟁의 세계관이 전략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전략적 선택을 축소하는 독을 뿌리고 있다.
조형진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중국학술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喬良, 王湘穗. 1999. 『超限戰』. 解放軍文藝出版社.
喬良, 王湘穗. 2014. 『超限戰』(十五週年紀念版). 長江文藝出版社.
번역본은 이정곤 옮김. 2024. 『초한전』. 교우미디어.
위에서 언급한 윌리엄슨 머레이의 편저는 Williamson Murray, Peter R. Mansoor eds. 2012. Hybrid Warfare: Fighting Complex Opponents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사진 출처
사진 1. wikipedia의 『초한전』 표지 사진
-
2025.02
-
2025.01
-
2024.12
-
2024.11
-
2024.10